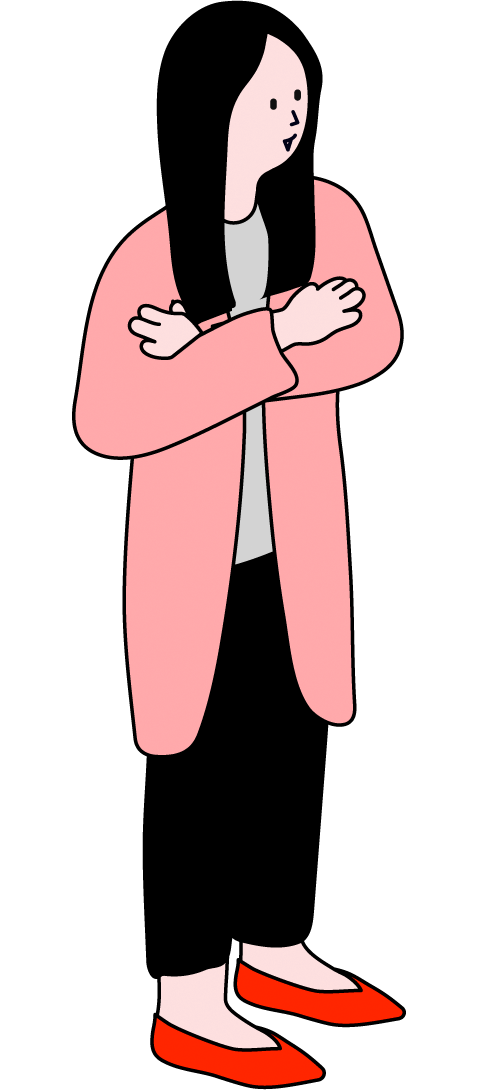목차
나만의 우주 말하기나만의 우주 말하기나만의 우주 말하기나만의 우주 말하기
pause
Episode 04
세
대
의
언
어
를
연
극
으
로
통
역
하
기
문원섭, 임서진
스태프 관객
관객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작품의 공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원섭 무대감독과 임서진 사운드 디자이너는 5편 이상의 청소년극에 참여한 베테랑 스태프들입니다. 스태프이자 관객이 바라보는 청소년극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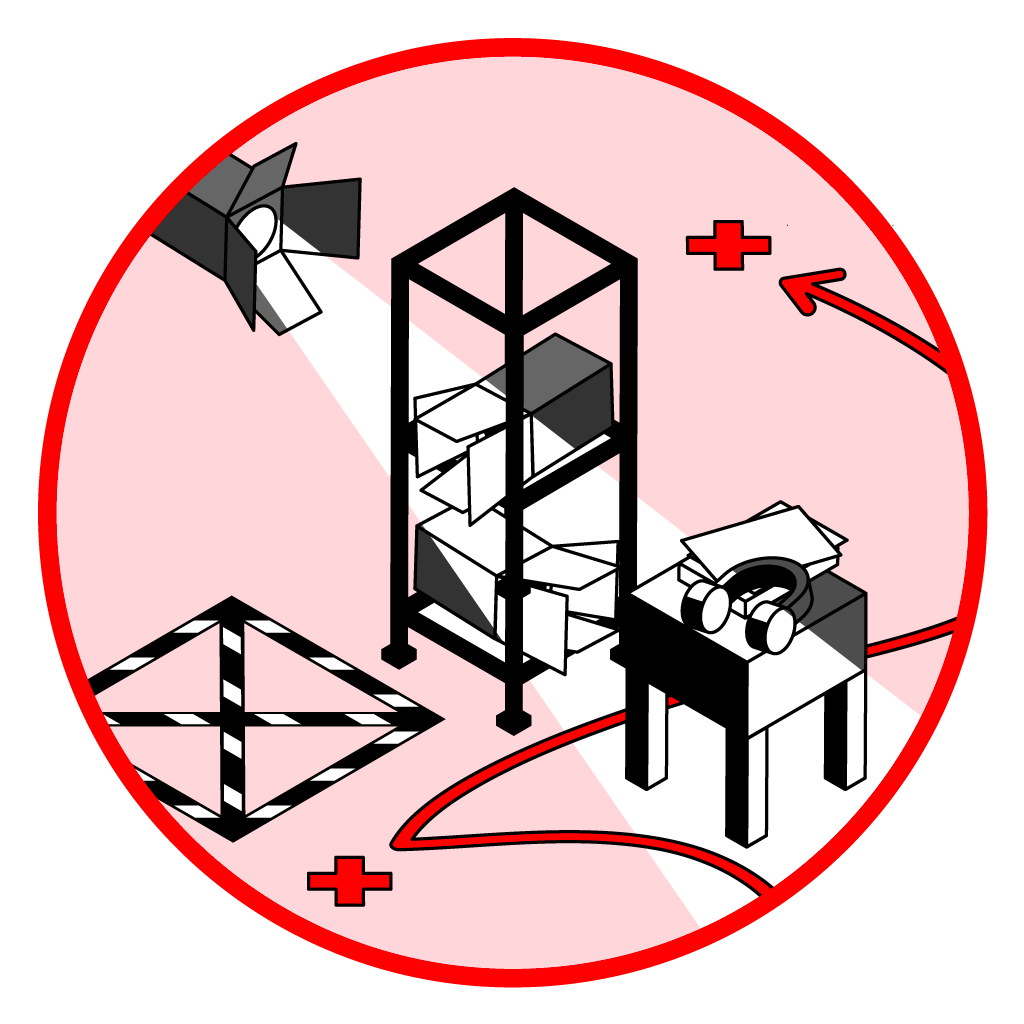
Episode 04
세대의 언어를 연극으로 통역하기
스태프 관객
ⓒ국립극단
Q1
5편 이상의 청소년극에 참여하셨는데요. 청소년극은 기존의 연극과 많이 다른가요?임서진
외부에서도 청소년이 주인공인 작품을 할 때가 있지만 굳이 청소년극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년’이라는 관객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돼요. 실재하는 청소년들이 창작 단계에서부터 협업하면서 서로의 경험이 휘발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도 들고요. 청소년극이 성인과 청소년 사이를 통역하는 것 같아요.
문원섭
일단 짧죠. 짧은 시간에 여러 얘기를 담기 때문에 되게 압축적이에요. 특히<레슬링 시즌>이나 <비행소년 KW4839>, <죽고 싶지 않아>처럼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그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에요. 사실 제가 공연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건 에어컨이에요. 덥거나 지루하면 부채질이 나와요. 확실히 솔직하고 빨라요.
ⓒ국립극단
Q2
스태프가 아닌 관객의 입장으로 보고 좋아하게 된 작품도 있나요?문원섭
저는 토니 그래함 연출가 작업이 다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이나 설정의 어색함과 정서적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노란달>에는 아랍계 소녀가 나오죠. <타조소년들>도 청소년극이지만 계급 문제를 다뤄요. 이런 작품들이 <비행소년 KW4839>나 <죽고 싶지 않아>처럼 열광적인 관객의 반응을 끌어내지 않더라도, 관객을 숙고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요. 연극은 인간이 세계에 던지는 질문이라고 봐요. 토니 그래함 연출의 작품을 보면서 청소년극을 빙자한 더 진지하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국립극단
Q3
중학생 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극을 만들고 관람한 후, 딸과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졌나요?임서진
<죽고 싶지 않아>에 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청소년의 전두엽이 50%가 재 세팅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라고.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갖더라고요. 그럴 때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줘요. 동등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최근에는 “우리 반에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