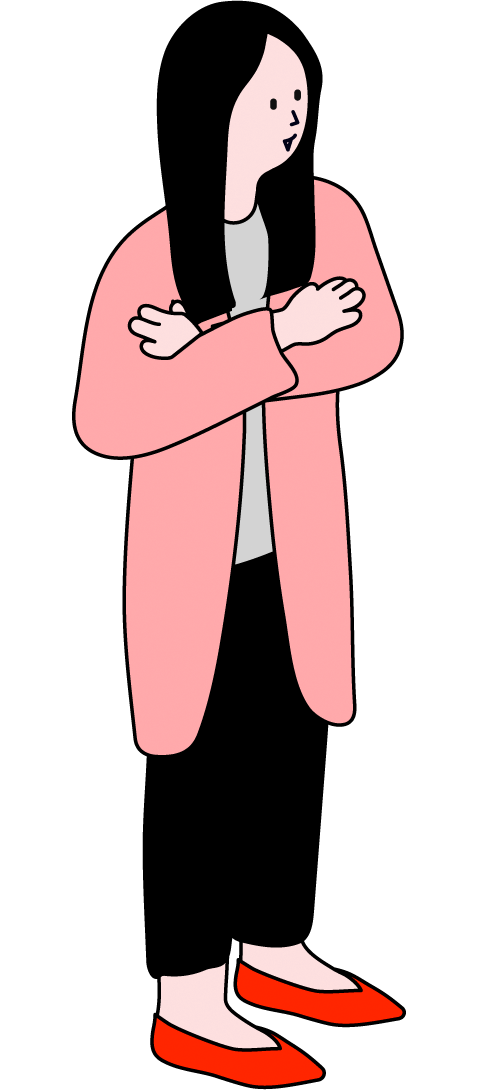하는
관객
10주년 기념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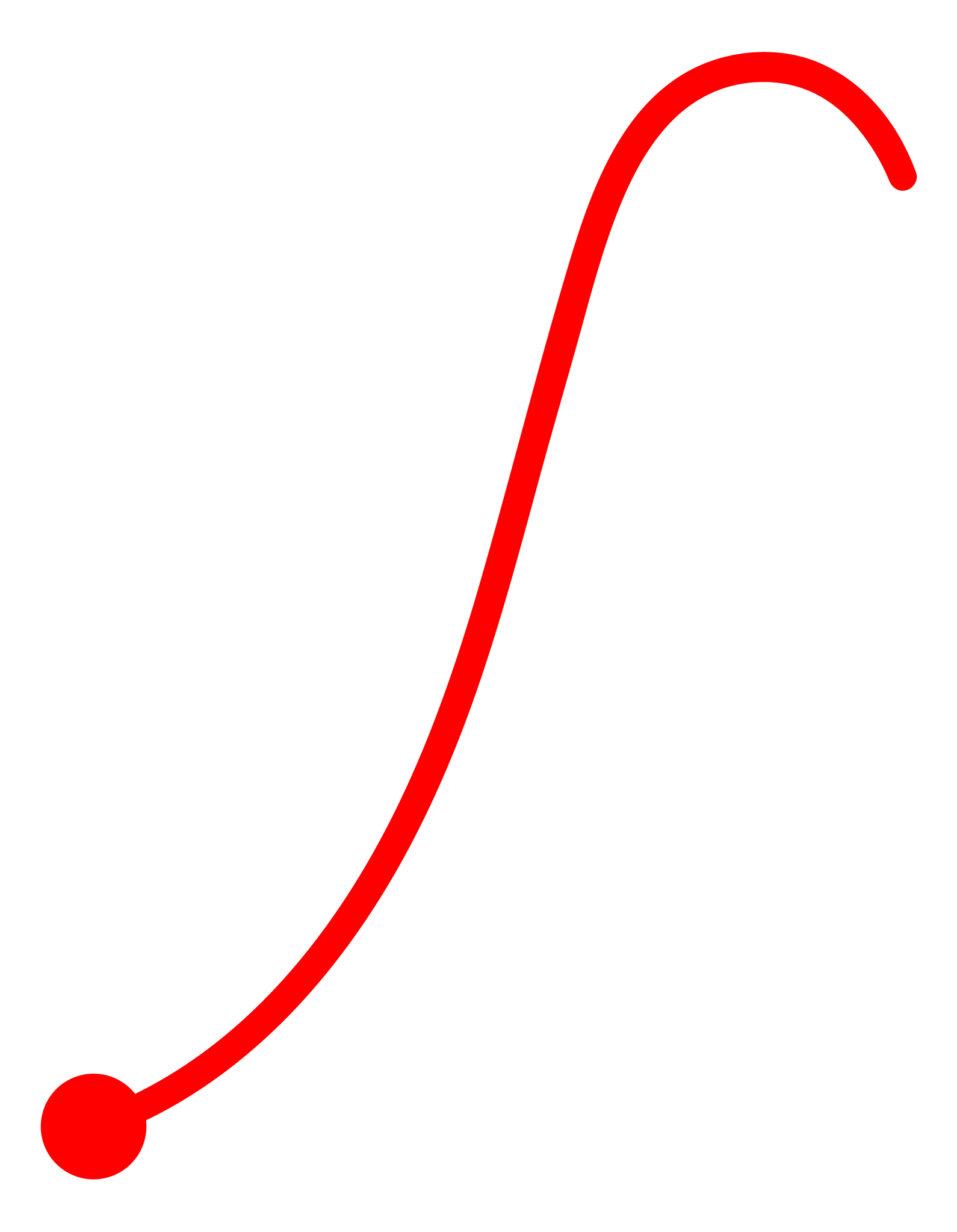
2011년 5월 2일에 출범해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연구와 작품개발을 해왔다. 10년간 청소년을 문화 주체로 인지하고, 이들과의 직접 소통을 바탕으로 지금 청소년의 고민과 태도를 연극에 담았다. 2011년 <소년이 그랬다>를 시작으로 2021년의 <더 나은 숲>에 이르는 19편의 연극이 제작됐다. 청소년을 주축으로 한 연극은 청소년 관객의 공감을 넘어 성인 관객으로 확장됐다. 보편의 감정은 세대 연결의 순간으로 이어지며, 청소년극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지난 10년간 국립극단에서는 19편의 청소년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청소년극 하는 관객’은 지난 10년간 국립극단 청소년극과 함께한 관객의 이야기입니다. 세대와 상황이 다른 다섯 그룹 열두 명을 만나 우리가 사랑한 작품, 인상적이었던 순간, 관람 후 달라진 삶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관객이 무슨 이유로 극장에 찾아오는 걸까? 그래서 연극을 만드는 이가 아닌, 관객의 구체적인 경험에 집중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섯 그룹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김민정, 김새솔, 김은빈은 10대 초반 청소년을 다룬 <영지>로 만났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민정과 새솔은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영지>의 일부가 되었던 경험을, 협력 교사였던 김은빈 선생님은 아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어른이자 교사로서의 고민을 들려주었습니다.
권지윤과 황웅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청소년극과 함께 뜨거운 청소년기를 보낸 청소년 관객입니다. ‘청소년 17인’으로 활동한 과거를 돌아보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문화 주체로서의 경험, 청소년기에 청소년극을 본다는 것의 힘에 관해 물었습니다.
김예은, 나수연, 임영규는 국립극단 청소년극 대표작으로 꼽히는 <죽고 싶지 않아>의 관객들입니다. 이들은 격렬한 무대 위의 움직임이 자신의 현실을 뒤흔들었다고 고백해주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확신을 더하고,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는 관객의 경험이 연극의 짙은 영향력을 느끼게 합니다.
문원섭 무대감독과 임서진 사운드 디자이너는 청소년극의 스태프이자 관객입니다. 무대감독이 기억하는 청소년 관객만의 문화, 청소년의 소리를 마주하며 경험한 변화 등을 살펴봤습니다.
김대곤과 김시준은 부자 관객입니다. 지난가을에 공연된 <더 나은 숲>을 함께 보고, 정체성과 기준, 전통과 같은 소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듯 같은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관객은 ‘함께 뛰는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의 일부를 리듬 게임의 형식을 차용해 동적으로도 구현했습니다. 관객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느끼고,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만난 지난 공연들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극장에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타인과 세상을 가깝게 연결하는 힘이 연극에 있습니다.